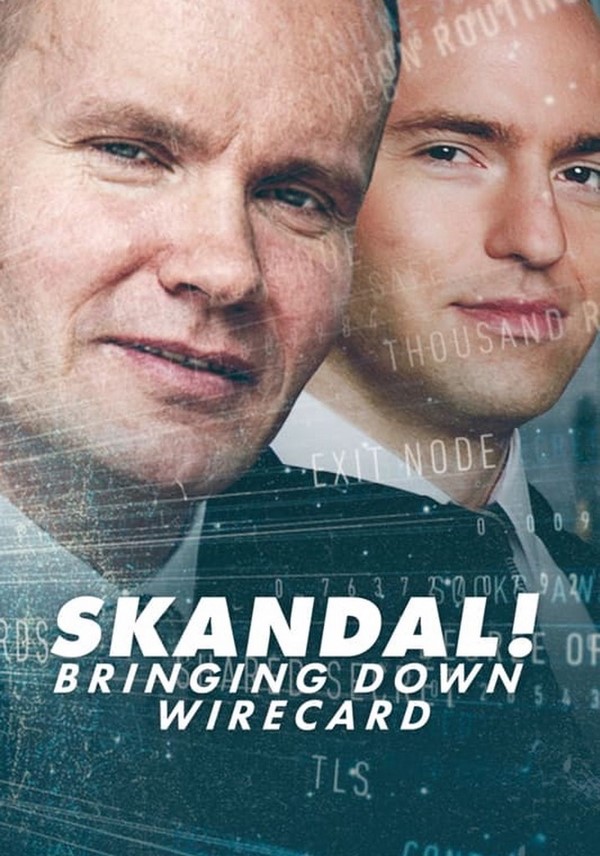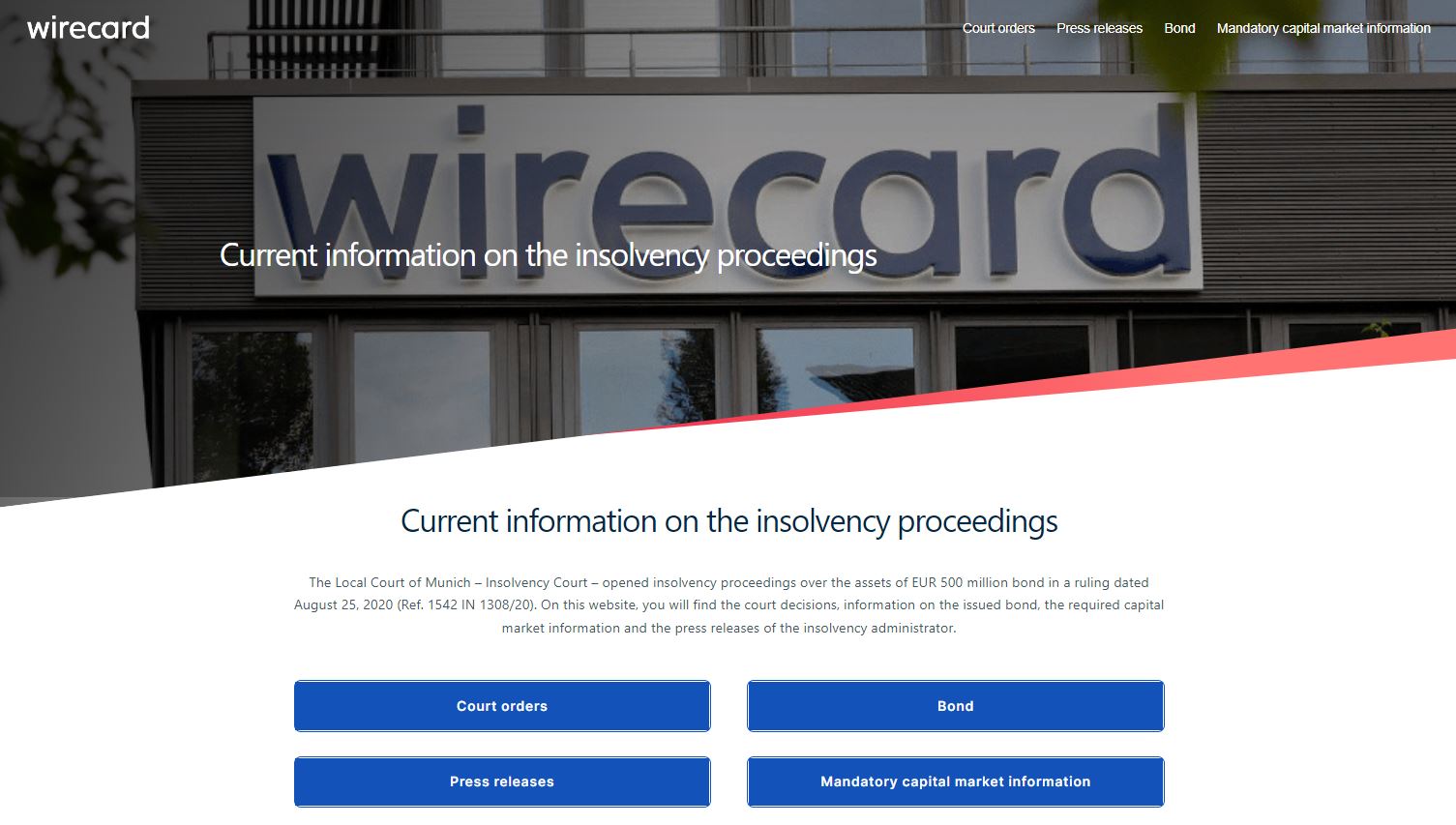■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새로운 트렌드와 테크놀로지를 대하는 자세의 결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스캔들! 와이어 카드를 폭로하다 │2022
감독 : 제임스 어스킨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새로운 트렌드와 테크놀로지를 대하는 자세의 결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스캔들! 와이어 카드를 폭로하다 │2022
감독 : 제임스 어스킨
▲ ‘스캔들! 와이어 카드를 폭로하다’ 포스터
어느새 우리가 흔히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제4차 산업혁명' 같이 새로운 개념이 미디어에 돌면 대개 그것에 압도되고 대개는 그런 흐름에 빨리 편승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트렌드 관련 책이 넘쳐나는 이유다. 남을 의식하기 쉬운 문화적 풍토를 가지고 있다면, 남과 비교하고 뒤처지지 않으려는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저널리즘이 더욱 필요하다. 그 본질을 파헤치는 탐사 저널리즘은 더욱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제4차 산업 혁명같이 새로운 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나라는 영국, 미국이 아닌 독일이다. 다만, 그들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을 썼다. 독일은 전통 산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개념에 주목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독일에서 놀랍게도 ‘와이어카드(Wire card)’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회계부정이 일어났다. 전자결제 기업 ‘와이어 카드’는 선불기반 가상결제 서비스인 E-wallet(Emoney)를 주축으로 디지털 전자 결제를 지원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자기 자금이 없어도 무료로 어디서나 먼저 쓸 수 있는 카드를 주기 때문에 돌풍을 일으켰다. 제4차 산업 혁명과도 같은 최첨단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신산업 즉, 핀테크 혁명의 모범으로 보였기에 와이어카드의 파산은 더욱 충격이 컸다. 한때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방크’의 기업가치를 뛰어넘으며 승승장구했던 ‘와이어카드’가 왜 갑자기 파산했을까? 파산에 이르렀다면 분명 심각한 내부 문제가 잠재돼 있었을 텐데 회사는 어떻게 건재할 수 있었을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스캔들! 와이어카드를 폭로하다’는 이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 핀테크 산업의 선두 주자였던 '와이어카드'의 민낯이 드러나는 데는 외부의 힘에 굴하지 않는 우직한 저널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스캔들! 와이어 카드를 폭로하다’ 스틸컷
세상에 알려진 바로는 ‘와이어 카드(Wire card)’가 회계 장부 조작이 알려지면서 파산한 것이라 했지만,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다른 측면을 부각한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2015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기자가 처음 실마리를 잡은 것은 와이어 카드가 범죄 집단의 돈을 세탁해준다는 제보였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유럽만이 아니라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07년 싱가포르, 2014년 씨티은행 선불카드 사업을 인수하며 미국에도 진출했다.
사실 제보 내용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내용이었다. 이보다 결정적인 제보는 내부에서 나왔다. 전 회계 책임 내부 고발자는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주며, ‘와이어 카드’가 매출액과 수출액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특히, 필리핀 은행에 있다는 19억 유로(2조 6천억)가 존재하는지 의문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내부 자료를 통해 추출하는 데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다. 기자들은 해킹을 당할까 봐 인터넷 선을 차단하고 별도의 노트북을 금고에 넣고 분석할 때만 문을 여는 첩보전을 방불케 하며 자료를 분석 정리했다. ‘와이어 카드’는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는데 더 큰 어려움은 흔들리지 않고 되치기하는 ‘와이어 카드’ 자체에 있지 않았다.
▲ ‘스캔들! 와이어 카드를 폭로하다’ 스틸컷
마침내 어렵게 ‘와이어 카드’의 의혹을 보도했을 때, 기자들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당연히 시작될 줄 알았지만, 금융 규제당국인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취재 보도한 기자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다고 몰아붙이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러 ‘와이어 주가’를 떨어뜨려 공매도로 돈을 벌려고 의심했다. 심지어 중앙은행 반대에도 와이어 카드의 공매도를 두 달간 조치했다. 당국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당시 분위기 때문일지 모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하우스 오브 와이어 카드'(House of Wire card)라며 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처음에는 여론조차 싸늘했다. 1999년 출발한 와이어 카드는 여러 이유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어있었다. 독일을 비롯해 유럽에서 핀테크 산업에서 표본 모델이자 자부심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이해관계가 이미 얽혀 있었다. 전문 투자가들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들도 와이어 카드를 옹호했고,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난했다. 주식 시장에서 승승장구했고,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방크보다 자산규모가 커져 인수할 수 있다는 말도 공공연했다. 2018년 기업가치는 270억 달러, 프랑크푸르트거래소 30대 기업(DAX30)에 들었다. 특히, 미래 산업과 스타트업에 천재적인 투자가라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도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었다.
▲ ‘와이어카드'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이렇게 경제적 성역이 된 ‘와이어 카드’에 대한 보도가 힘들었던 것은 이뿐이 아니다. 각종 알 수 없는 공포의 위협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다른 언론보다 인상적인 점은 와이어 카드의 COO 얀 마르살렉(Jan Marsale)에 특히 주목한다는 점이다. 스릴러 영화처럼 그와 러시아 정보기관과의 연관성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알 수 없는 검은 자금 세탁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더 슈피겔>, <더 인사이더>는 마르살렉이 해고된 지 몇 시간 후에 민스크로 날아갔다고 했고, 2020년 7월 19일, 독일 한델스블라트는 마르살렉이 모스크바 인근 저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점은 <파이낸셜타임스> 기자들이 취재 도중 끊임없이 누군가의 감시와 도청에 시달린 배경을 추측하게 한다. 즉, ‘와이어 카드’는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자에 대해 미행, 도청, 감청, 협박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영화는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할 수 없던 것을 시도한 중심에 마르살렉이 있었다고 얘기한다.
결국 비디오유니뱅크(BDO)와 필리핀군도은행(BPI)에 있으리라던 19억 유로(2조 6천억)의 돈이 없었고, 해당 은행에는 ‘와이어 카드’ 계좌 자체도 없었다. 마침내 진실이 알려지면서 이 기업은 바로 파산했다. 100유로 대의 주가는 일주일 사이 1유로 대로 99% 이상 폭락했다. 마침내 ‘와이어카드’는 상장 폐지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많은 이들에게 돌아갔다. 만약, 일찍 언론의 보도를 사용했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직을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독일인들의 상처는 더욱 컸다. 온갖 불법의 중심에 있던 얀 마르살렉 혼자 미리 도피했다. 2020년 7월 2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은 마르살렉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러시아로 이체한 것으로 보도했는데, 사라진 19억 유로가 마르살렉을 통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 ‘스캔들! 와이어 카드를 폭로하다’ 스틸컷
이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절대적 신화와 영웅 만들기가 이뤄질 때 불순한 외부의 침입도 매우 심화할 수 있고, 이를 언론조차 외면할 때 국가적으로나 세계 전체에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이다. 무조건 새로운 신기술 하이테크놀로지라는 담론이 형성된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것의 본질을 겨냥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고, 버블을 일으키며 인간에게 동기 부여하여 증식한다. 그 증식은 대거 누군가의 피를 먹고 이루어질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범죄 집단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만다.
다시 ‘4차 산업혁명’ 이란 단어를 매우 추종하고 있는 한국을 돌아본다. 독일처럼 그런 사례가 없을 수 있을까? 전통 산업 비중이 커서 뭔가 새로운 신기술에 열등감을 가진 점은 같지 않을까? 언론은 이런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가상화폐, 핀테크를 포함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탐사 저널리즘을 발휘하고 있는지 묻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뒤흔들었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카카오 먹통 사태 등을 생각할 때, 여전히 대부분 새로운 시장 형성과 거품을 만드는 데 언론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스캔들! 와이어 카드를 폭로하다’ 포스터